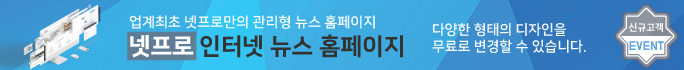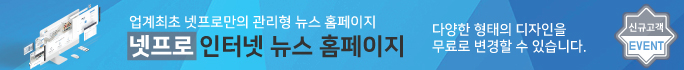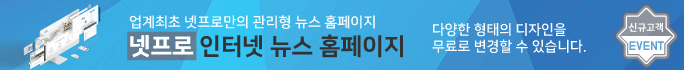워싱턴포스트, 한국 젊은이들, 현존하는 “지옥”, 대한민국 탈출하려 해
-
– 한국은 “금수저”와 “흙수저”의 나라, “답도 없고 미래도 없어”
– “비정규직”의 나라, 작년 젊은층 취업 인구의 3분의 2가 비정규직
– 헬조선 페이스북 그룹 등, 수많은 온라인 사이트, “헬조선” 탈출 방법 소개어느덧 너무 익숙해져 버린 단어 ‘헬조선’.
‘헬조선’은 돌파구 없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삶을 대변하는 단어다. 이 단어가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왜곡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기술한 기사가 지난 1월 31일자 워싱턴포스트지에 실려 깊은 관심을 받았다.
기사는 한국의 젊은세대(20~30대)가 처한 현실을 다양한 분야의 젊은이들과의 인터뷰 및 한국이 처한 사회현상 분석을 통해 전하고 있다.
일주일을 사무실에서 기거하며 일을 하지만 담당PD 문자 한통에 해고될수 있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으면 급여조차 나오지 않는 근무조건하에서 일하는 26세의 작가와 “한국에서, ‘파트타임’ 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풀타임을 뜻한다”고 말하는, 법대를 휴학하고 조합에서 시간제 근무자로 일하고 있는 22세 젊은이,
그리고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일주일에 5일을 맥도널드와 베이커리 체인점에서 일을 하지만 수입의 절반이 쪽방 임대료로 나가는 현실에 처해 있는 젊은이와 ‘한국에서 자녀들을 키우기는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34세 직장인 등의 인터뷰를 통해 “헬조선”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기사는 1960-70년대 이룩한 놀라운 경제 성장 이후에 태어난 이들 세대는 내리막길만을 볼 일만 남았으며 대기업을 직장으로 둔 사람들 외 다른 이들은 그럭저럭 살아갈 뿐이라고 말한다.
또한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산업화가 한창이던 예전과 더욱 큰 격차를 느꼈고 경제 쇠락을 절감했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헬조선’현상을 적극적으로 탈피하려 한다며 온라인 포럼들에 헬조선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조언들이 제시되고 있는 현상을 상세히 전했다.
한 젊은 여성이 호주로 이민을 떠나는 내용의 소설 작품 “한국이 싫어서”는 작년 최고 베스트 셀러가 됐고 한 일간지에 기재된 “망국선언문”은 재빠르게 퍼져나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젊은이들을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코리안 드림”을 이룩한 부모들이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었다. 이것은 탈출구가 없는 지옥이다”는 한 젊은이의 말을 전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wapo.st/1PrWFEy
Young South Koreans call their country ‘hell’ and look for ways out
한국 젊은이들, 한국을 “지옥”이라 칭하며 벗어날 길을 찾는다
By Anna Fifield
January 31 at 7:00 AM

A lone office worker is doing an overtime shift in downtown Seoul. (Jun Michael Park/For The Washington Post)
서울 시내에서 한 회사원이 혼자 야근을 하고 있다.SEOUL — Don’t be fooled by the bright lights, the zingy K-pop music, the ubiquitous technology. South Korea is, in the minds of many young people here, a living hell — and they’re not going to take it anymore.
서울- 현란한 불빛과 신나는 케이팝 음악 그리고 만연한 첨단기술에 현혹되지 말라. 한국은, 많은 젊은이들이 마음속에, 현존하는 지옥이고 그들은 더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이다.
It’s a place where, according to a growing number of 20- and 30-somethings, those born with a “golden spoon” in their mouths get into the best universities and secure the plum jobs, while those born with a “dirt spoon” work long hours in low-paying jobs without benefits.
한국은, 점점 늘어가는 20-30대에 의하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이 보장되는 반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혜택도 없는 박봉의 직장에서 장시간 일을 하는 곳이다.
This Korea even has a special name: “Hell Joseon,” a phrase that harks back to the five-century-long Joseon dynasty in which Confucian hierarchies became entrenched in Korea and when a feudal system determined who got ahead and who didn’t.
이같은 한국에는 특별한 이름이 있다: “헬조선”- 한국에 유교적 위계질서가 확립되고 봉건제도가 출세할 사람과 못할 사람을 결정했던 500년 조선 왕조를 상기시키는 표현이다.
“It’s hard to imagine myself getting married and having kids. There is no answer or future for us,” says Hwang Min-joo, a 26-year-old writer for television shows.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내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 우리에게는 답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작가인 26세의 황민주 씨는 말한다.
Hwang often goes to work on a Monday morning with her suitcase, not leaving again until Thursday night. She eats at her office, takes a shower at her office, sleeps in bunk beds at her office. “If I finish work at 9 p.m., that’s a short day,” she said.
황 씨는 종종 월요일 아침에 여행용 가방을 들고 출근해 목요일 밤까지 퇴근하지 않는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식사하고 사무실에서 샤워하며 사무실에 마련된 침상에서 잠을 잔다. 황 씨는 “밤 9시에 일이 끝나면 빨리 끝난 것이다”고 말했다.
Paychecks come irregularly — or not at all, if the show gets axed — and because she doesn’t have a contract, Hwang wonders when she goes to sleep each night whether she’ll still have a job in the morning. She can make this life work only by living at home with her parents — when she goes home, that is.
“If you have enough money, South Korea is a great place to live. But if you don’t . . .” she trails off.월급은 지급이 일정하지 않으며 -만약 프로그램이 중단되기라도 하면 월급은 아예 없다 – 황 씨는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므로 매일 잠자리에 들며 내일 아침에 아직 일자리가 있을지 걱정한다. 황 씨가 현재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 부모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집에 가게 될 때는 그렇단 말이다.
“돈이 충분하면 한국은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말끝을 흐린다.
Kim Hyeon-min, 22, works for a lawyer as a contract worker. He worked as an intern at the National Assembly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If your congressperson doesn’t like you, he or she can easily lay you off. Job security is volatile at best. Still, I’m hopeful. I would like to gain more experi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run for it someday.” (Jun Michael Park/For The Washington Post)
22세의 김현민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직 노동자로 일한다. 그는 학교 졸업 후 국회에서 인턴으로 일한 적이 있다. “그 의원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면 너를 쉽게 해고할 수 있다. 직업 안정성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불안정하다. 그래도 난 희망이 있다. 나는 국회에서 경험을 더 쌓고 싶고, 언젠간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Hwang Min-joo, 26, is a TV writer. “When I go to sleep, I don’t even know whether I will have my job tomorrow. I can be laid off with a single text message from my producer. If my program doesn’t air, I don’t get paid. I live with my parents, and that’s how I am able to survive.” (Jun Michael Park/For The Washington Post)
26세의 황민주 씨는 TV 작가이다. “잠자리에 들 때 나는 이 일자리를 내일도 가지게 될지조차 모른다. 프로듀서의 문자 한 통이면 나는 해고될 수 있다. 내 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으면, 나는 임금 지급을 못 받는다.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Such complaints are common among Hwang’s generation. Their parents lived through South Korea’s astonishing economic rise during the 1960s and ’70s and then saw democracy arrive in the ’80s. But those born after that period of rapid improvement see only the downside: megalithic businesses that provide status and good pay for their employees, with everyone else just muddling through.
그런 불평들은 황 씨의 세대에 있어 흔한 일이다. 그들의 부모님들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한국이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하던 시대를 살았고, 80년대에는 민주화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빠른 성장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쇠락을 볼 뿐이다: 직원들에게 사회적 지위와 좋은 급여를 제공하는 대기업이 있고, 그 외 다른 이들은 그저 그럭저럭 살아나가고 있을 뿐이다.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lost jobs, homes and hopes. But in South Korea, such losses are felt especially acutely because of the sharp contrast with the heady days of industrialization.
2008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직장, 집, 그리고 희망을 잃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산업화가 한창 이루어지던 예전과의 큰 격차 때문에 사람들이 그 피해를 더 크게 느낀다.
The economy is sputtering — growth slowed to 2.6 percent last year — and its slide has been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irregular” jobs that offer no security and no benefits, a trend felt keenly by those trying to get on the job ladder. Almost two-thirds of the young people who got jobs last year became irregular workers, according to Korea Labor Institute figures.
경제는 침체 상태로 – 작년에 2.6 퍼센트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 이 성장률 둔화는 직업 안정성과 혜택이 없는 “비정규직”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 경향은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느껴진다.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하면, 작년에 직장을 구했던 젊은이들의 거의 3분의 2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Even people at the conglomerates are feeling the pinch, with big names such as Samsung, Hyundai and Doosan laying off workers or calling for early retirement.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쪼들림을 느끼는데 이는 삼성, 현대 그리고 두산 같은 유명 회사들도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조기 퇴직을 권고하기 때문이다.

Workers occupy brightly lit offices and do overtime shifts in downtown Seoul on a Thursday night. (Jun Michael Park/For The Washington Post)
목요일 밤 서울의 도심에서 회사원들이 환하게 불이 켜진 사무실에서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다.Amid the gloom, more and more young Koreans are taking to social networks to complain about their plight.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젊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힘든 상황을 소셜 네트워크에 토로한다.
There’s a Hell Joseon group on Facebook that boasts more than 5,000 members and a dedicated “Hell Korea” website that posts graphic after graphic to illustrate the awful state of life in South Korea: the long working hours, the high suicide rate and even the high price of snacks.
오천 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페이스북 헬조선 그룹이 있고, 긴 근무 시간, 높은 자살률, 그리고 심지어는 비싼 간식비 등의 끔찍한 한국의 생활 상태를 보여주는 그래픽들이 나열된 “헬조선” 전용 사이트가 있다.
Numerous online forums offer advice on ways to escape. Some help South Koreans apply to the U.S. military, a move that can offer a fast track to U.S. citizenship. Others offer advice on training programs for aspiring welders, a skill that is reportedly in demand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수많은 온라인 포럼들은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조언을 제시한다. 어떤 포럼은 한국인들에게 미국 군대에 지원해 미국 시민권을 빨리 얻는 방법을 안내한다. 또 다른 포럼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수요가 많다고 전해지는 한참 인기가 좋은 용접공이 되기 위한 직업 훈련을 권하기도 한다.
And it’s not just an Internet phenomenon. Novelist Jang Kang-myung’s “Because I Hate South Korea” — a fictional work about a young woman who emigrated to Australia — shot to the top of bestseller lists last year.
그리고 이것은 인터넷상의 현상만은 아니다. 소설가 장강명 씨가 쓴, 한 젊은 여성이 호주로 이민을 떠나는 내용의 소설 작품 “한국이 싫어서”는 작년 최고 베스트 셀러에 올랐다.
When writer Son A-ram published a piece titled “The Declaration of a Ruined State” in the Kyunghyang Shinmun newspaper, it quickly went viral.
손아람 작가가 경향신문에 “망국선언문”을 기고하자 이것은 재빠르게 퍼져 나갔다.
“If my life continues this way, I don’t really see much of a future,” says Lee Ga-hyeon, a 22-year-old who has taken time off her law studies to work at a union for part-time workers. “In South Korea, ‘part time’ means working full-time hours at the minimum wage.”
“만약 내 인생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나는 진짜 미래가 없다”고 법대를 휴학하고 한 조합에서 시간제 근무자로 일하고 있는 22세의 이가현 씨는 말한다. “한국에서, ‘파트타임’ 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풀타임을 뜻한다.”
While she was studying, Lee worked at McDonald’s and then at a bakery chain, often working six hours a day, five days a week, in addition to studying full time. The rent on her “shoe-box-size” room cost almost half her monthly earnings of $450.
이 씨는 휴학하기 전, 학업과 병행해 일주일에 닷새, 그리고 하루에 6시간을 맥도널드, 그리고 그 후에는 베이커리 체인점에서 일했다. “쪽방” 같은 고시원 임대료는 이 씨의 한 달 벌이 450달러의 거의 절반이었다.
“I want to become a certified labor lawyer so that I can help others in similar circumstances,” she said.
“나는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동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이 씨는 말했다.
Not that those with more stable jobs are much happier. In this working culture, 14-hour days are the norm. In 2012, a left-leaning presidential candidate ran on the slogan: “A life with evenings.”
그렇다고 더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근로 문화에서 하루 14시간 노동은 보통이다. 2012년 한 진보 성향의 대통령 후보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Song, 34, works at a small company and has a 13-month old daughter. “It is difficult to dream about the future and raise children here. Workers can’t get off work on time because of peer pressure and companies almost take overtime work for granted. I used to work for a big company. My boss always said, ‘The company comes first; your family comes second.’ ” (Jun Michael Park/For The Washington Post)
34세의 송 씨는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13개월 된 딸이 있다. “한국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어렵다. 노동자들은 동료들로부터 느끼는 압박 때문에 제때에 퇴근할 수가 없고 회사는 시간외 근무를 거의 당연시 한다. 나는 대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다. 상사는 늘 ‘회사가 우선이고 가족이 다음이다’고 말했다.”
Chang Han-sol, 21, is a journalism student. “I used to live in Germany when I was very young. My parents were studying in Germany, and after South Korea’s democratization, they decided to come back. I think I grew up in a middle-class family, but I don’t know whether I can ever afford to live like my parents.” (Jun Michael Park/For The Washington Post)
21세의 장한솔 씨는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학생이다. “아주 어렸을 때 독일에서 살았다. 부모님들은 독일에서 공부하셨고 한국이 민주화되면서 귀국을 결심하셨다. 우리 가족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과연 부모님들처럼 살 만한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다.”Song, a 34-year-old whose wife had to quit her job when they had their daughter last year, switched to a less-prestigious job because he was regularly working from 8 a.m. one day until 1 a.m. the next. “My boss always said, ‘The company comes first; your family comes second.’ ” said Song, who asked to withhold his full name for fear of getting into trouble at work.
지난해 아이를 가졌을 때 아내가 일을 그만두어야 했던 34세의 송 씨는 보통 오전 8시에 시작해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일하는 스케줄 때문에 명성이 덜한 직장으로 옮겼다. “사장은 늘 ‘회사가 우선이고 가정은 그다음’이라고 말했다”고 송 씨는 말하며 직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했다.
Most frustrating of all, many young people say, is that their parents, who worked long hours to build the “Korean dream,” think the answer is just to put in more effort.
많은 젊은이들은 무엇보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오랜 시간을 일해서 “코리안 드림”을 이뤄낸 부모들은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점이라고 말한다.
“My parents think I don’t try hard enough,” said Yeo Jung-hoon, 31, who used to work for an environment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but now runs a Facebook group called the “Union of Unskilled Workers.”
“우리 부모님은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고 민간 환경단체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비숙련노동자노조”라는 페이스북 그룹을 운영하는 31세의 여정훈 씨는 말했다.
“One time after a meeting, my boss said in front of everyone, ‘I don’t think you’re suitable for this job.’ I felt humiliated, but I couldn’t quit because I needed the money. It is a hell without an exit.”
“한 번은 회의가 끝난 후 상사가 모두 앞에서 ‘나는 네가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었다. 이것은 탈출구가 없는 지옥이다.”
Yoonjung Seo contributed to this report.
Anna Fifield is The Post’s bureau chief in Tokyo, focusing on Japan and the Koreas. She previously reported for the Financial Times from Washington DC, Seoul, Sydney, London and from across the Middle East.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